전시를 알려드립니다.
옴니버스 사진전 <슬픈 열대>
Tristes tropiques

이순행 작 <온실>
일 시 | 7월 30∼8월 12일
초 대 | 7월 30일(수) pm.6, 8월 6일(수) pm.6
장 소 | 갤러리 룩스
서울 종로구 관훈동 185번지 인덕빌딩 3층 (Tel. 720-8488)
옴니버스 제1부 <그리움의 추상> 7월 30일∼8월 5일
박혜림 <봄이 될 즈음에>
음미경 <숨>
이순행 <온실>
이지현 <어둠 속에서의 기억의 재현>
최영진 <사라진 것들에게 대한 그리움>
옴니버스 제2부 <못다한 말들> 8월 6일∼8월 12일
김성규 <시간이 머물다 간 자리>
김원섭 < From Borobudur >
손미자 <길에 대하여>
윤정희 <난곡>
황보나 <침묵을 넘어선 세상>
슬픈 열대 - 내게로 향한 여행 앞에서
사진이 세상을 비추는 창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진이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레비-스트로스의 소설 <슬픈 열대>와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슬픈 열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슬픈 자화상이자 그것은 또 서구 파라다이스의 종말을 예견하는 것이라고. 분명 그럴 것이다. 진정 사진이 세상을 노출하고 세상을 끌어들이는 진실의 그릇이라면 그 진실의 그릇은 레비-스트로스가 "슬픈 열대"를 통해서 말하려 했던 사라짐에 대한 슬픈 연가이거나, 내게로 향한 슬픈 여행임에 틀림없다.

박혜림 <봄이 될 즈음에>
진실은 구체적이다. 자아와 사유의 접점에서 말해지는 삶의 이야기라면 더욱 구체적이다. 사진의 명료한 묘사적 기록성은 그래서 큰 무기이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말라르메의 시에서 느끼고, 보들레르의 시에서 전율하듯이 생은 그렇게 늘 구체적이지 않다. 상징은 오히려 몸을 감출 때, 오직 은유적으로만 말할 때 더 아름답고 애절하며 생의 이쪽과 저쪽을 관류할 수 있다. 삶의 진실이 늘 정면을 통해서 말해지지 않듯, 삶의 진정성과 인간 존재의 가치도 상징을 통해서 말해질 때 더 깨달음이 클 때도 있다. 사진의 비밀스러움은 여기에 있다.

음미경 <숨>
옴니버스 사진전 <슬픈 열대>는 비밀스러움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전시가 테제로 하는 "슬픈 열대"란 그 점에서 삶의 진실에 다가서는 비밀스런 우리의 자화상이자 세상과 자아를 비추는 창과 거울로서 생의 이면에 대한 일기장의 모습이다.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에서처럼 이들의 사진들도 자아와 타자를 반영하는 슬픈 연가이다. 옴니버스 제1부 "그리움의 추상"은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옴니버스 제2부 "못다한 말들"은 말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연민을 각각 사진이라는 투명한 그릇을 통해 투영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사진에 눈길을 건네고, 말을 건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마도 "왜 사유의 방식이 자기 고백적이어야 하는가"에 있게 될 것이다.

이지현 <어둠 속에서의 기억의 재현>
열대는 상징주의자의 시처럼 '자연'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적 문명과 문화에 의해 파괴되거나 상실해 가는 슬픈 그 무엇이다. 열대는 슬프고, 자기 고백적인 것은 여기에 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레비 스트로스가 그러했듯이, 자기 고백적으로 자연 앞에서 자아를 탐색하고 조망의 시선을 던진다. 그리하여 너를 향하고, 너를 조망함으로써 너를 통해 나를 보는, 생의 전면과 이면을 횡단하는 자아와 사유의 접점에 서게 된다. 너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이며, 그것은 결국 너, 나, 우리이고 또한 타자이자 자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최영진 <사라진 것들에게 대한 그리움>
삶에 대한 이해는 말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을 걸고 귀기울일 때 온다. 삶에 대한 성찰 또한 지금 이 순간 사라져 가는 모든 시간들에 대해 연민의 눈길을 던질 때 온다. 참여한 작가들의 사진들은 자연에 동화된 삶,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그것들의 역사와 시간성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욕망 때문이 아니다. 바로 우리들 눈앞에서 파괴되거나 소멸해 가는 역사와 시간 때문이다. "슬픈 열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
(글. 진동선, 사진평론가)

김성규 <시간이 머물다 간 자리>

김원섭 < From Borobudur >

손미자 <길에 대하여>

윤정희 <난곡>

황보나 <침묵을 넘어선 세상>
* 류형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07-28 13:39)
옴니버스 사진전 <슬픈 열대>
Tristes tropiques

이순행 작 <온실>
일 시 | 7월 30∼8월 12일
초 대 | 7월 30일(수) pm.6, 8월 6일(수) pm.6
장 소 | 갤러리 룩스
서울 종로구 관훈동 185번지 인덕빌딩 3층 (Tel. 720-8488)
옴니버스 제1부 <그리움의 추상> 7월 30일∼8월 5일
박혜림 <봄이 될 즈음에>
음미경 <숨>
이순행 <온실>
이지현 <어둠 속에서의 기억의 재현>
최영진 <사라진 것들에게 대한 그리움>
옴니버스 제2부 <못다한 말들> 8월 6일∼8월 12일
김성규 <시간이 머물다 간 자리>
김원섭 < From Borobudur >
손미자 <길에 대하여>
윤정희 <난곡>
황보나 <침묵을 넘어선 세상>
슬픈 열대 - 내게로 향한 여행 앞에서
사진이 세상을 비추는 창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진이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레비-스트로스의 소설 <슬픈 열대>와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슬픈 열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슬픈 자화상이자 그것은 또 서구 파라다이스의 종말을 예견하는 것이라고. 분명 그럴 것이다. 진정 사진이 세상을 노출하고 세상을 끌어들이는 진실의 그릇이라면 그 진실의 그릇은 레비-스트로스가 "슬픈 열대"를 통해서 말하려 했던 사라짐에 대한 슬픈 연가이거나, 내게로 향한 슬픈 여행임에 틀림없다.

박혜림 <봄이 될 즈음에>
진실은 구체적이다. 자아와 사유의 접점에서 말해지는 삶의 이야기라면 더욱 구체적이다. 사진의 명료한 묘사적 기록성은 그래서 큰 무기이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말라르메의 시에서 느끼고, 보들레르의 시에서 전율하듯이 생은 그렇게 늘 구체적이지 않다. 상징은 오히려 몸을 감출 때, 오직 은유적으로만 말할 때 더 아름답고 애절하며 생의 이쪽과 저쪽을 관류할 수 있다. 삶의 진실이 늘 정면을 통해서 말해지지 않듯, 삶의 진정성과 인간 존재의 가치도 상징을 통해서 말해질 때 더 깨달음이 클 때도 있다. 사진의 비밀스러움은 여기에 있다.

음미경 <숨>
옴니버스 사진전 <슬픈 열대>는 비밀스러움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전시가 테제로 하는 "슬픈 열대"란 그 점에서 삶의 진실에 다가서는 비밀스런 우리의 자화상이자 세상과 자아를 비추는 창과 거울로서 생의 이면에 대한 일기장의 모습이다.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에서처럼 이들의 사진들도 자아와 타자를 반영하는 슬픈 연가이다. 옴니버스 제1부 "그리움의 추상"은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옴니버스 제2부 "못다한 말들"은 말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연민을 각각 사진이라는 투명한 그릇을 통해 투영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사진에 눈길을 건네고, 말을 건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마도 "왜 사유의 방식이 자기 고백적이어야 하는가"에 있게 될 것이다.

이지현 <어둠 속에서의 기억의 재현>
열대는 상징주의자의 시처럼 '자연'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적 문명과 문화에 의해 파괴되거나 상실해 가는 슬픈 그 무엇이다. 열대는 슬프고, 자기 고백적인 것은 여기에 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레비 스트로스가 그러했듯이, 자기 고백적으로 자연 앞에서 자아를 탐색하고 조망의 시선을 던진다. 그리하여 너를 향하고, 너를 조망함으로써 너를 통해 나를 보는, 생의 전면과 이면을 횡단하는 자아와 사유의 접점에 서게 된다. 너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이며, 그것은 결국 너, 나, 우리이고 또한 타자이자 자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최영진 <사라진 것들에게 대한 그리움>
삶에 대한 이해는 말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을 걸고 귀기울일 때 온다. 삶에 대한 성찰 또한 지금 이 순간 사라져 가는 모든 시간들에 대해 연민의 눈길을 던질 때 온다. 참여한 작가들의 사진들은 자연에 동화된 삶,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그것들의 역사와 시간성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욕망 때문이 아니다. 바로 우리들 눈앞에서 파괴되거나 소멸해 가는 역사와 시간 때문이다. "슬픈 열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
(글. 진동선, 사진평론가)

김성규 <시간이 머물다 간 자리>

김원섭 < From Borobudur >

손미자 <길에 대하여>

윤정희 <난곡>

황보나 <침묵을 넘어선 세상>
* 류형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07-28 1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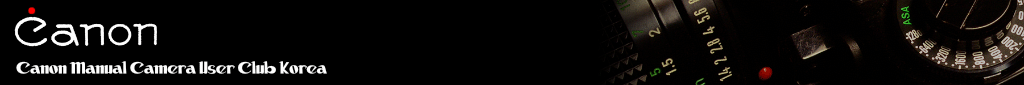
 canon 메뉴얼 기기 (그림감상^^)
canon 메뉴얼 기기 (그림감상^^)
30일, 6일 초대라고 하면 작가와의 만남? 그런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